2012 구로 아리랑 (상) 구로공단, 어떻게 변해왔나
중년이 된 여공의 한숨
휴대전화 조립 공장서
하루 11~15시간씩 노동
손에 쥐는건 월 130만원
중년이 된 여공의 한숨
휴대전화 조립 공장서
하루 11~15시간씩 노동
손에 쥐는건 월 13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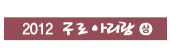 1991년 봄, 당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전보해(가명·40·여)씨는 서울 변두리의 집에서 지하철을 타고 구로공단역(지금의 구로디지털단지역)에 내렸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전씨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이 구로공단이었다. 그는 공장 경비실마다 붙어 있는 ‘사원모집’ 공고를 보고, 가장 깔끔해 보이는 전자제품 부품공장에서 일자리를 잡았다.
21년이 지난 지금도 전씨는 구로공단의 휴대전화 조립공장에서 일한다. 공단 안에서만 10번째 직장이다. 그동안 공단 이름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이하 서울디산)로 바뀌고 고층의 아파트형 공장이 빽빽하게 들어차는 등 많은 게 달라졌다. 하지만 전씨의 노동 여건은 예전과 큰 차이가 없다.
매일 아침 8시30분까지 출근하는 전씨는 비좁은 탈의실에서 제진복으로 갈아입고 클린룸에서 먼지를 떨어낸 뒤 회의용 탁자만한 작업대에 앉는다. 그리고 이르면 저녁 7시, 늦으면 밤 11시까지 온종일 휴대전화를 조립한다. 지난달 어느 늦은 밤 만난 전씨는 이날 하루 10명의 조원들과 함께 휴대전화 1100대를 만들었다고 했다. 연장근무 탓에 눈이 충혈돼 있던 그는 “공장 스케줄은 원청이 요구하는 물량에 따라 변한다”며 “그래서 작업이 끝나는 시간도 밤 8시든, 11시든 그때그때 다르다”고 했다.
전씨는 휴대전화 성수기인 여름에는 한달에 300여시간, 평소에는 250여시간을 일한다. 정밀성을 요하는 작업이라 휴대전화에 얼굴을 파묻고 일할 수밖에 없어 어깨와 목·손목 등이 금세 아파 오지만 휴식시간은 오전 10분, 오후 10분, 점심시간 1시간뿐이다. 평소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살아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일해 전씨가 손에 쥐는 돈은 기본금에 상여금을 더해 월평균 130여만원 남짓. 법정 최저임금에 연장 근로수당을 더한 수준이다. 전씨는 “20년 동안 공장 10곳을 옮겨다녔지만 언제나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최저임금(시간당)이 840원이던 1991년 전씨는 한달에 30만원을 받고 일했다. 1993년엔 제법 큰 공장에 취직해 월급이 60만원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하지만 1995년께부터 공장들이 지방과 외국으로 이전하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더니, 1998년 외환위기 땐 정리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아파트형 공장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2000년 이후엔 인력파견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 일반화하면서, 구로공단에서 비정규직·저임금·장시간 노동의 굴레를 벗어나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전씨는 구로공단 밖의 다른 일을 알아보려 해봤지만 실패하고 다시 인력파견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20년 전 어린 전씨의 옆자리는 20대 젊은 여공이 채웠지만 이제는 40~50대 중년 여성들이 채우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라, 잔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곳을 찾고 있다. 이들은 20년 전과 다름없이 자신보다 나이 어린 관리자들한테서 “집안 살림도 이따위로 하느냐”와 같은 싫은 소리를 들으며 일한다.
전씨는 “배운 사람들이 공단을 많이 찾고, 건물이 화려하게 올라간 것 말고는 공단의 실상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1991년 봄, 당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전보해(가명·40·여)씨는 서울 변두리의 집에서 지하철을 타고 구로공단역(지금의 구로디지털단지역)에 내렸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전씨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이 구로공단이었다. 그는 공장 경비실마다 붙어 있는 ‘사원모집’ 공고를 보고, 가장 깔끔해 보이는 전자제품 부품공장에서 일자리를 잡았다.
21년이 지난 지금도 전씨는 구로공단의 휴대전화 조립공장에서 일한다. 공단 안에서만 10번째 직장이다. 그동안 공단 이름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이하 서울디산)로 바뀌고 고층의 아파트형 공장이 빽빽하게 들어차는 등 많은 게 달라졌다. 하지만 전씨의 노동 여건은 예전과 큰 차이가 없다.
매일 아침 8시30분까지 출근하는 전씨는 비좁은 탈의실에서 제진복으로 갈아입고 클린룸에서 먼지를 떨어낸 뒤 회의용 탁자만한 작업대에 앉는다. 그리고 이르면 저녁 7시, 늦으면 밤 11시까지 온종일 휴대전화를 조립한다. 지난달 어느 늦은 밤 만난 전씨는 이날 하루 10명의 조원들과 함께 휴대전화 1100대를 만들었다고 했다. 연장근무 탓에 눈이 충혈돼 있던 그는 “공장 스케줄은 원청이 요구하는 물량에 따라 변한다”며 “그래서 작업이 끝나는 시간도 밤 8시든, 11시든 그때그때 다르다”고 했다.
전씨는 휴대전화 성수기인 여름에는 한달에 300여시간, 평소에는 250여시간을 일한다. 정밀성을 요하는 작업이라 휴대전화에 얼굴을 파묻고 일할 수밖에 없어 어깨와 목·손목 등이 금세 아파 오지만 휴식시간은 오전 10분, 오후 10분, 점심시간 1시간뿐이다. 평소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살아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일해 전씨가 손에 쥐는 돈은 기본금에 상여금을 더해 월평균 130여만원 남짓. 법정 최저임금에 연장 근로수당을 더한 수준이다. 전씨는 “20년 동안 공장 10곳을 옮겨다녔지만 언제나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최저임금(시간당)이 840원이던 1991년 전씨는 한달에 30만원을 받고 일했다. 1993년엔 제법 큰 공장에 취직해 월급이 60만원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하지만 1995년께부터 공장들이 지방과 외국으로 이전하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더니, 1998년 외환위기 땐 정리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아파트형 공장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2000년 이후엔 인력파견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 일반화하면서, 구로공단에서 비정규직·저임금·장시간 노동의 굴레를 벗어나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전씨는 구로공단 밖의 다른 일을 알아보려 해봤지만 실패하고 다시 인력파견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20년 전 어린 전씨의 옆자리는 20대 젊은 여공이 채웠지만 이제는 40~50대 중년 여성들이 채우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라, 잔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곳을 찾고 있다. 이들은 20년 전과 다름없이 자신보다 나이 어린 관리자들한테서 “집안 살림도 이따위로 하느냐”와 같은 싫은 소리를 들으며 일한다.
전씨는 “배운 사람들이 공단을 많이 찾고, 건물이 화려하게 올라간 것 말고는 공단의 실상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첨단 지식산업의 메카라고 불리는 서울디산에는 옛 구로공단의 흔적인 4000여개의 제조업체가 아직 남아 있고, 5만3000여명의 제조업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서울디산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이들은 20년 전 노동자들이 짊어졌던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쳇바퀴를 아직도 굴리고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