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십대 청년이 먼저 읽고 그리다. 장태희

“긴급하게 도움을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아프리카 난민 에밀이 아기를 출산해 중고 경차를 구합니다. 예산은 이백만원 정도인데, 혹시 주변에 차 바꾸는 분 있으면 연락해주세요.” 작년 초, 동네 톡방에 올라온 은혜씨 글이다. 평소 활발하던 톡방인데 이날은 댓글이 별로 없었다. 아프리카 난민이라니 비현실적이었던 것 같다. 경기 파주 연풍리 용주골, 한국전쟁 이후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집창촌이 있던 마을이다. 집값이 싸서 지금은 아프리카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산다. 파주에는 이주노동자가 많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들은 물론 ‘불법’ 체류 노동자들도 적지 않다. 그중 상당수가 정치적, 종교적 이유 등으로 삶의 뿌리가 뽑혀 떠밀려온 난민이다. 난민 인정률이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에서 대개 ‘투명인간’으로 살아간다. 은혜씨가 다니는 작은 교회가 용주골과 인연을 맺은 건 십여 년 전, 독거노인 가구처럼 병들고 힘든 이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면서였다. “오 년 전부터 검은 피부의 외국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배가 터질 것 같은 만삭의 외국인 여성이 눈물을 쏟을 듯 걷고 있는 걸 지나칠 수가 없었지요.” 어떻게 난민 지원을 하게 됐는지 묻는 말에 교회 사모님 연주씨의 대답이다. 아프리카,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박해와 재해를 피해 온 난민들의 사연은 제각각이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건 같다. 난민 중에는 여성 혼자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 아이를 돌봐주어야 한다. 연주씨가 보육센터를 연 이유다. “낡은 연립주택 한 층을 빌려 보육센터를 열었어요. 아이들 세 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스무 명이 넘어요.” 휴대폰 속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는 연주씨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 제인은 내전으로 집이 폭파되고 갈 곳이 없어져 남편과 함께 한국에 왔다. 난민 인정을 못 받고 불법체류자로 지냈는데 얼마 전 남편이 단속에 걸려 본국으로 송환됐다. 그사이 태어난 아이를 홀로 키운다. 마이크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빠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뇌수종으로 대수술을 받았고, 본인도 혈관이 터져서 대수술을 받았다. 난민들은 가구공장, 박스공장, 헌옷공장 등에서 최저임금으로 일하는데, 숙련기술도 없고 연고도 없으니 무거운 짐 나르기처럼 힘든 일을 한다. 먼지 심한 공장에서 종일 서서 일한다. 병을 달고 사는 이유다. 큰 수술을 받아야 할 때도 있다. 십시일반 후원을 받고, 수술비를 많이 깎아주는 병원들 덕분에 고비를 넘긴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호시탐탐 잘사는 선진국으로 갈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들을 받아주면 임금과 노동의 질이 하락하고 범죄는 늘어날 것이다.” 난민에 대한 통념이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바네르지와 뒤플로 부부에 따르면 사실은 반대다. 고국을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내전, 재난 같은 위험에 처한 이들 중 교육 수준과 삶의 의욕이 높은 소수만 떠난다. 난민은 도착한 나라에서 번 돈을 쓰고 세금도 낸다.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유다. 난민 증가와 범죄율 사이에 관계가 없다는 실증연구도 여럿이다. “난민들은 예배하러 올 때 화려한 장신구, 하이힐로 멋지게 꾸미고 와요. 스마트폰도 잘 다루고 적응도 빠르고 당당해요.” 은혜씨가 전하는 난민의 모습이다. 같이 봉사하는 신도 중 당혹해하는 경우도 있단다. “도움받는 사람은 불쌍하고 위축돼야 한다는 것도 우리 안의 편견이 아닌가 싶어요.” 난민 주제에 휴대폰 쓴다며 예멘 난민을 비난하던 때가 생각난다. 난민은 열심히 사는 보통사람이고, 우리 이웃이다. 재작년 마을 바자회 때는 수익금 절반인 50만원을 아프리카 이주노동자에게 기부했다. 마을 톡방에 올라오는 세간살이는 난민, 이주노동자들과 나누기도 한다. 가까운 이웃 한 명은 오래전부터 난민들과 사진 활동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교회로 ‘공장에서 일할 난민 없느냐’는 문의가 왔어요. 난민들 없이는 돌아가지 못하는 공장도 많아요.” 난민과 이주민 없이는 공장도, 농장도, 건설 현장도, 재래시장도 돌아가지 않는다. 일하고 아이 낳아 키우고 소비하는 이웃이지만 난민은 투명인간이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팍팍한 살림에도 난민을 돕는 이유를 은혜씨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 나고 자란 난민 아이들은 여기서 살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지 못해요.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해야 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요.” 전태일의 죽음과 시다들의 고통에 빚져서 잘살게 된 나라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이들이 일하고 있다. 함께 살 궁리를 하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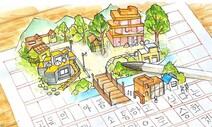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2/20250212500150.webp)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2715.webp)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3664.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