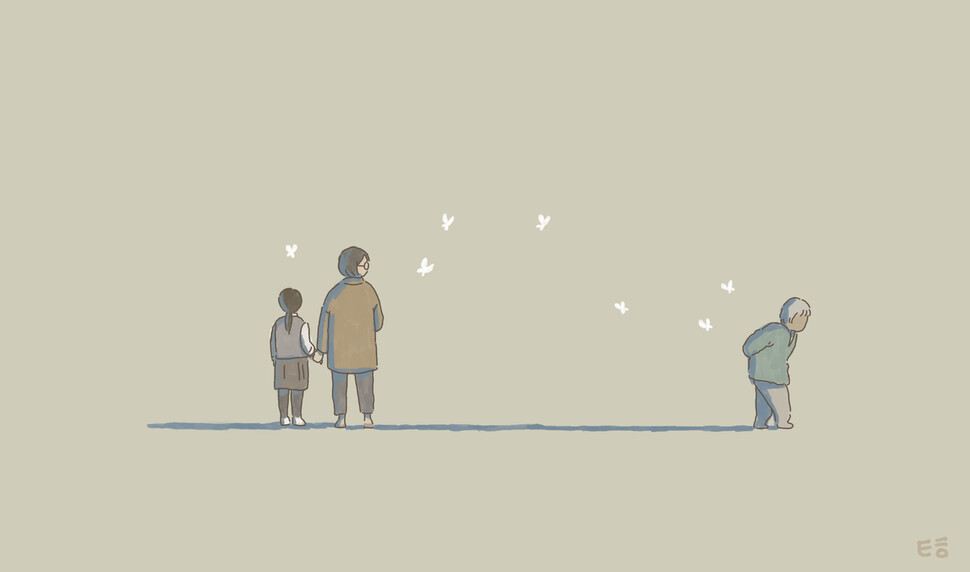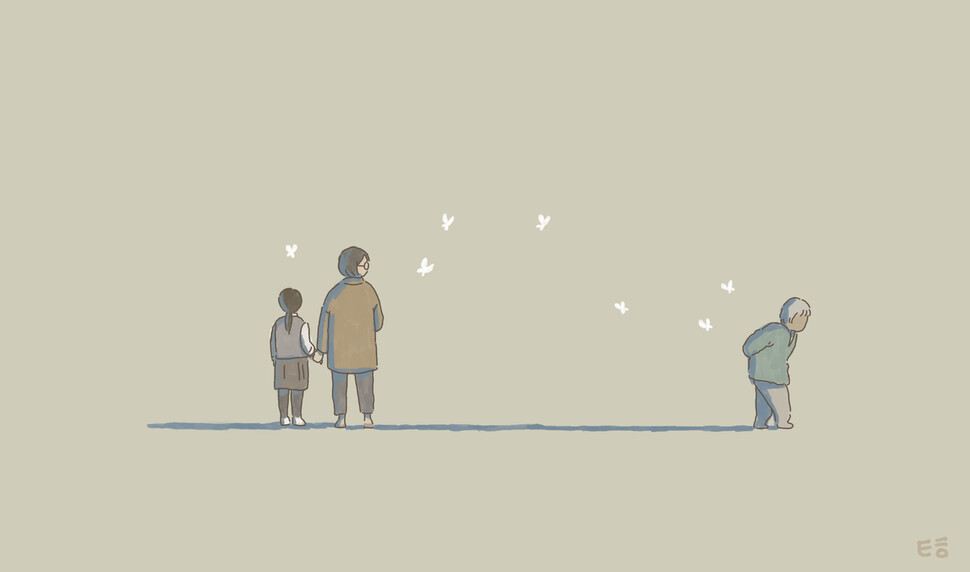스무살 청년이 ‘김여사의 어쩌다 마을’을 먼저 읽고 그리다. 장태희
엄마는 시인이다. 40대 후반 늦은 나이에 일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 “구청에서 하는 문화센터에 등록했다”더니 여러해 후 나름 인지도 높은 잡지로 등단해서 진짜 시인이 됐다. 시집도 두어권 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감동하곤 한다. 내게도 감동이다. 진심을 말하자면, 나는 그런 엄마가 좀 힘들다.
엄마는 60대 중반까지 생계를 위해 조그만 식당을 꾸렸다. 주방과 홀을 넘나드는 엄마의 노동은 늘 고단했는데 그래도 빚은 줄지 않았다. 낮의 식당일이 끝나면 밤에는 시를 썼다. 그 주경야독이 엄마의 삶을 지탱한 힘이었다. 그렇게 30년간 시를 썼다. 시를 쓴 후에도 엄마는 늘 가난했고 자주 아팠다. 엄마의 인생처럼 엄마의 시도 어둡고, 깊고, 축축하고 때로 섬뜩했다. 게다가 엄마의 시는 ‘해체’, ‘하이퍼리얼리즘’을 지향하는 어려운 시였다. 왜 서정시를 쓰지 않고 이리 어려운 시를 쓰냐고 물은 적이 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거기 문학의 본령에 닿는 길이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엄마는 대학을 다닌 적이 없지만, 나이 예순에 철학, 미학 공부를 시작했다. 공부하다 물음이 생기면 인문학 공부하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라캉이니 들뢰즈니 하는 사상가들에 관해 묻곤 했다. 엄마는 그 어려운 개념들을 자기 언어로 이해하고 시로 녹여냈다.
글쓰기를 업으로 삼는 이들이 많은 동네라서 그런지 늦깎이 시인 엄마 이야기에 이웃들은 더 깊이 감동하곤 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시인 엄마가 종종 힘들다. 자의식 강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엄마는 시인이면서 ‘소녀’ 같다. 엄마에게는 세상 풍파를 견뎌낸 노인의 담담한 무심함이 없다. 날 선 감수성으로 삶과 세상의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하려 한다. 그래서 엄마는 몸과 마음이 자주 아프다. 그 엄마를 보듬고 돌보는 일이 내게는 고달픈 노동이다. 시인 엄마라는 근사한 타이틀보다 생활력 강하고 여장부 같은 엄마를 나는 종종 갈구했다.
7년 전 내가 서울을 떠나 경기도 외곽 멀리 이사한다는 말을 꺼냈을 때 엄마는 많이 서운해했다. 하지만 이사 간 동네에서 이웃들과 알콩달콩 지낸다는 소식을 전하자 딸의 생활에 빙의된 듯 즐거워했다. “엄마 열무김치를 이웃들이 참 좋아해요.” 내 말에 엄마는 여름마다 열무김치를 잔뜩 담가주신다. 엄마의 열무김치는 8할이 이웃들과 나눔으로 나가고, 이웃들은 김장김치며 낙지며 민어며 온갖 귀한 것으로 엄마에게 고마움을 표하곤 한다. 이웃들의 시인 엄마 칭송을 들으며 엄마의 세계를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된 것도 같다. 엄마에겐 나의 엄마 노릇 말고도 다른 삶이 있다는 걸.
코로나로 고향에 가지 못한 조용한 설 명절, 중년 여성 넷이 모여 풍성한 명절 뒷담화를 펼쳤다. 이날의 주제는 엄마였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엄마는 그립고 안쓰럽고, 힘든 존재였다. 봉실은 오직 아들만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집착한 엄마가 섭섭했다. 그 엄마가 일찍 가셨으니 더 서럽다. 대신 생활력 강하고 살가운 시어머니가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며느리, 시어머니 둘이서 여행을 다니게 됐으니 진짜 엄마가 됐다.
맏며느리인 애라의 시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6남매를 키웠다. 기도 세고 아들에 대한 기대도 높으니 힘든 시어머니였다. 60살 되던 해에,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를 키웠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주는 용돈으로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하며 살란다”라고 선언했다. 처음엔 이해도 안 가고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맙다. 나이 들어서도 자식들 걱정에 몸과 마음이 병드는 수많은 엄마들보다, 당신 한 몸 건강하고 즐겁게 살겠다는 어머니의 ‘이기적’ 결심이 오히려 현명해 보인다. 애라네 시어머니처럼 우리도 ‘자신을 지키며 이기적으로 살자’고 다짐했다.
릴라 언니 엄마는 또 달랐다. 심성 곱되 무능한 남편 대신 자식 일곱을 번듯하게 키워낸 여장부였다. “농촌에서는 논에 물 대는 수로 확보가 정말 중요해요. 그때 다른 집은 사내들이 나오는데, 우리 집은 엄마가 먼저 나가서 원하는 곳에서 웃통 벗고 버티곤 했어요. 사내들이 안절부절못하면서 자리를 피했죠.” 릴라 언니 엄마의 에피소드는 마치 소설 속의 빛나는 이야기만 같았다. 그 엄마가 억척스레 일해 빚도 다 갚고 살 만해질 무렵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단다. 우리는 함께 숙연해졌다.
우리 엄마들도 여러 겹의 삶을 살았다. 우리가 그때 엄마의 나이가 되자 그 여러 겹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어떤 엄마, 어떤 여성, 어떤 이웃, 어떤 시민으로 살아가게 될까? 엄마를 생각하며 엄마만은 아닌 삶을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