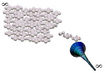창의력 쑥쑥 퀴즈 사람은 많은 정보를 보는 것으로부터 얻는다. 지금도 신문을 보면서 글과 그림에 담긴 정보를 얻고 있다. <그림2>는 1908년에 발표된 프레이저의 나선이다. 달팽이집과 같이 연속적으로 뱅글뱅글 돌아 나오는 나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색연필을 들고 선 한 개를 골라 천천히 따라 가 보자. 뱅글뱅글 도는 나선이 아니라 완전한 동그라미가 그려질 것이다. 프레이저의 나선은 실제로는 동그라미를 여러 개 그려놓은 것이다. 단지 배경에 우리의 뇌가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이미지를 심어놓고 있다. 사람이 본다는 것은 사물에 반사된 빛에 정보를 실어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하고 그 정보를 다시 시신경이 뇌로 전달하고 뇌가 인지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경험도 다르고 알고 있는 지식도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본다’의 의미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 프레이저의 나선처럼 배경의 이미지가 착각하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림3>처럼 언뜻 보기에는 그럴 듯 해 보여도 찬찬히 따져보면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는 만들어 질 수 없는 모양도 있다. 뇌가 착각을 하더라도 예리한 과학적 사고로 시각적 이미지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림4>의 모양은 실제로 가능한 것일까? 아니면 뇌가 착각을 일으키도록 만든 것에 불과할까? 문미옥/이화여대 와이즈거점센터(wise.or.kr) 연구교수
[ 지난주 정답]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