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복 교사의 시사쟁점! 이 한권의 책
[함께하는 교육] 우리말 논술 /
안광복 교사의 시사쟁점! 이 한권의 책
안광복 교사의 시사쟁점! 이 한권의 책
[난이도 수준-고2~고3]
12. 전쟁본능 - ‘전쟁문화’가 없는 한반도, 불안한 연평도
<전쟁본능> 마틴 판 크레펠트 지음 /이동훈 옮김/살림
목받침(Neckstock)은 10㎝가 넘었다. 이는 목을 곧추세워주는 장식이었다. 60~70년대 검은색 옛 교복의 딱딱한 깃도 목받침 가운데 하나다. 군인들은 목받침이 들어간 군복을 좋아했다. 어깨가 쫙 펴지며 당당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에서는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목을 쭉 빼고 있으니 고개를 돌리기도 힘들다. 그럼에도 군인들은 좀처럼 목받침을 포기하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최고의 조종사, 즉 에이스(Ace)들은 자기 비행기를 화려하게 꾸몄다. 노란색, 붉은색 등. 이래서는 적의 눈에 더 잘 띄어 위험해질 뿐이다. 그래도 에이스들은 장식을 포기하지 않았다.
전투라는 목적에서 보자면 군복은 눈에 안 띌수록 좋다. 그러나 전쟁은 ‘영혼이 없는 살인전문 국가공무원’들이 벌이는 사업만은 아니다. 전쟁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영웅심, 명예욕, 과시 욕구 등등 숱한 감정이 끼어든다.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지 않으면 전쟁을 제대로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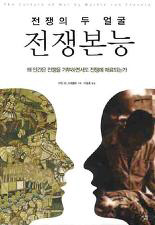 반면, 칸트는 냉정한 철학자였다. 그는 전쟁을 감싸는 온갖 허세를 벗겨내고 전쟁의 본모습을 제대로 짚어내었다. 칸트가 쓴 <영구평화론>을 보면 전쟁은 왕과 귀족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 벌이는 게임일 뿐이다. 그들은 죽고 죽이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전쟁터와 멀리 떨어진 궁정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소식을 귀동냥할 따름이다. 싸움판에 나선다 해도 죽을 가능성은 적다. 귀한 신분이라며 특별 대접을 받기 때문이다. 적으로 만났어도, 귀족들끼리는 서로 예의를 차리며 정중하게 대했다.
죽어났던 이들은 평민들뿐이었다. 왕과 귀족들도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면, 그래도 전쟁이 자주 일어날까? 칸트는 전쟁을 막으려면 공화정이 들어서야 한다고 힘주어 외친다. 보통 사람들이 권력을 쥐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쟁으로 당장 고통 받을 이들이 정치를 한다면 전쟁은 금세 세상에서 사라질 테다.
세상살이는 칸트의 주장처럼 돌아가지 않았다.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세상에서도 전쟁은 얼마든지 일어난다. 시민들은 전쟁에 열광하기까지 한다. 너도나도 목숨 걸고 싸움터로 달려가는 일도 흔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미국 남북전쟁 때 남군의 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 “전쟁이 끔찍하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전쟁을 너무 좋아하게 될지도 모른다.”
전쟁은 모두를 하나 되게 한다. 일상의 지루함은 사라지고 평범한 젊은이들도 영웅이 될 기회를 얻는다. 사람들은 승패를 가리는 스포츠 경기에 몹시 흥분한다. 전쟁은 운동경기를 뛰어넘는 ‘절대 스포츠’다. 엄청난 도구들을 써서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게임인 셈이다.
하지만 전쟁은 막싸움이 아니다. 문화와 전통에 따라, 나름의 의식(儀式)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전쟁을 하려면 선전포고를 해야 한다. 문명사회에서 살인은 절대 피해야 할 짓이다. 선전포고는 살인을 에워싸던 금지를 풀어준다. 이제부터 상대방을 일상과는 전혀 다른 규칙에 따라 대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물론, 적이라고 모두 막 죽일 수는 없다. 문화마다에는 적을 다루는 나름의 규칙이 있다. 예컨대, 성경의 <신명기>에서는 적을 세 종류로 나눈다. 첫째는 신이 저주한 적이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민족의 원수였다. 당연히 보는 족족 죽여 없애야 한다. 둘째는 이스라엘 땅에 먼저 살던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억한이 없다. 그래도 이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 살 땅을 얻기 위한 ‘국가 정책적 이유’에서다.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인 적이다. 이들을 어떻게 대할지는 때마다 달라진다. 이 점은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유럽인들끼리의 싸움에서는 적을 정중하게 대했다. 반면, 적이 유럽인이 아니었을 때는 짐승처럼 적을 다루었다.
전쟁을 할 때도 인간은 문화를 따른다. 정식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집단은 전 세계에 200여개 정도뿐이다. 오직 전쟁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가만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테러나 ‘분쟁’을 일으킬 뿐이다. 그러니 제대로 된 협상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다. 국가가 테러리스트들과의 대화나 협상에 고개를 내젓는 이유다.
전쟁의 마무리도 문화에 따라 이루어진다. 전쟁을 했던 나라는 ‘종전 선언’을 한다. 국가는 풀렸던 ‘살인 면허’를 거둬들인다. 승리를 기뻐하고 다친 이들을 위로한다. 전사자들을 모아 거두고 전리품을 나누기도 한다.
크레펠트는 이런 ‘전쟁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그는 전쟁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옛날 전쟁에서는 군인의 머리 가죽을 산 채로 벗기는 일도 적지 않았다. 포로들은 이런 모습을 눈 뜨고 지켜봐야 했다. 그럼에도 전쟁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현대의 병사들 가운데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심하게 앓는 이들이 많다. 왜 그럴까? 크레펠트는 그 이유를 제대로 된 전쟁문화가 없다는 데서 찾는다. 예전에 병사들은 전쟁이 끝내는 예식을 통해, 신에게 잘못을 빌고 죄를 덜었다. 전쟁이 과거가 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마음의 짐을 덜었던 셈이다.
지금은 어떤가? 전쟁은 선전포고 없이 일어난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절차도 무시되곤 한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제대로 된 종전 의례가 치러지지도 않는다. 어느덧 전쟁은 점점 야만에 가까워지고 있다.
연평도에서 큰 포격전이 있었다. 남북 간에는 제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전투를 벌였던 적이 없다. 앙금을 풀 만큼 전투 마무리를 깔끔하게 한 적도 없다. 그럴수록 증오는 위험수위를 넘어 부풀어 오른다. 전쟁문화가 통하지 않는 남북의 상황은 언제쯤 끝을 맺을까? 걱정이 늘어나는 요즘이다.
철학박사, 중동고 철학교사
timas@joongdong.org
반면, 칸트는 냉정한 철학자였다. 그는 전쟁을 감싸는 온갖 허세를 벗겨내고 전쟁의 본모습을 제대로 짚어내었다. 칸트가 쓴 <영구평화론>을 보면 전쟁은 왕과 귀족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 벌이는 게임일 뿐이다. 그들은 죽고 죽이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전쟁터와 멀리 떨어진 궁정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소식을 귀동냥할 따름이다. 싸움판에 나선다 해도 죽을 가능성은 적다. 귀한 신분이라며 특별 대접을 받기 때문이다. 적으로 만났어도, 귀족들끼리는 서로 예의를 차리며 정중하게 대했다.
죽어났던 이들은 평민들뿐이었다. 왕과 귀족들도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면, 그래도 전쟁이 자주 일어날까? 칸트는 전쟁을 막으려면 공화정이 들어서야 한다고 힘주어 외친다. 보통 사람들이 권력을 쥐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쟁으로 당장 고통 받을 이들이 정치를 한다면 전쟁은 금세 세상에서 사라질 테다.
세상살이는 칸트의 주장처럼 돌아가지 않았다.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세상에서도 전쟁은 얼마든지 일어난다. 시민들은 전쟁에 열광하기까지 한다. 너도나도 목숨 걸고 싸움터로 달려가는 일도 흔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미국 남북전쟁 때 남군의 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 “전쟁이 끔찍하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전쟁을 너무 좋아하게 될지도 모른다.”
전쟁은 모두를 하나 되게 한다. 일상의 지루함은 사라지고 평범한 젊은이들도 영웅이 될 기회를 얻는다. 사람들은 승패를 가리는 스포츠 경기에 몹시 흥분한다. 전쟁은 운동경기를 뛰어넘는 ‘절대 스포츠’다. 엄청난 도구들을 써서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게임인 셈이다.
하지만 전쟁은 막싸움이 아니다. 문화와 전통에 따라, 나름의 의식(儀式)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전쟁을 하려면 선전포고를 해야 한다. 문명사회에서 살인은 절대 피해야 할 짓이다. 선전포고는 살인을 에워싸던 금지를 풀어준다. 이제부터 상대방을 일상과는 전혀 다른 규칙에 따라 대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물론, 적이라고 모두 막 죽일 수는 없다. 문화마다에는 적을 다루는 나름의 규칙이 있다. 예컨대, 성경의 <신명기>에서는 적을 세 종류로 나눈다. 첫째는 신이 저주한 적이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민족의 원수였다. 당연히 보는 족족 죽여 없애야 한다. 둘째는 이스라엘 땅에 먼저 살던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억한이 없다. 그래도 이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 살 땅을 얻기 위한 ‘국가 정책적 이유’에서다.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인 적이다. 이들을 어떻게 대할지는 때마다 달라진다. 이 점은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유럽인들끼리의 싸움에서는 적을 정중하게 대했다. 반면, 적이 유럽인이 아니었을 때는 짐승처럼 적을 다루었다.
전쟁을 할 때도 인간은 문화를 따른다. 정식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집단은 전 세계에 200여개 정도뿐이다. 오직 전쟁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가만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테러나 ‘분쟁’을 일으킬 뿐이다. 그러니 제대로 된 협상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다. 국가가 테러리스트들과의 대화나 협상에 고개를 내젓는 이유다.
전쟁의 마무리도 문화에 따라 이루어진다. 전쟁을 했던 나라는 ‘종전 선언’을 한다. 국가는 풀렸던 ‘살인 면허’를 거둬들인다. 승리를 기뻐하고 다친 이들을 위로한다. 전사자들을 모아 거두고 전리품을 나누기도 한다.
크레펠트는 이런 ‘전쟁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그는 전쟁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옛날 전쟁에서는 군인의 머리 가죽을 산 채로 벗기는 일도 적지 않았다. 포로들은 이런 모습을 눈 뜨고 지켜봐야 했다. 그럼에도 전쟁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현대의 병사들 가운데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심하게 앓는 이들이 많다. 왜 그럴까? 크레펠트는 그 이유를 제대로 된 전쟁문화가 없다는 데서 찾는다. 예전에 병사들은 전쟁이 끝내는 예식을 통해, 신에게 잘못을 빌고 죄를 덜었다. 전쟁이 과거가 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마음의 짐을 덜었던 셈이다.
지금은 어떤가? 전쟁은 선전포고 없이 일어난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절차도 무시되곤 한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제대로 된 종전 의례가 치러지지도 않는다. 어느덧 전쟁은 점점 야만에 가까워지고 있다.
연평도에서 큰 포격전이 있었다. 남북 간에는 제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전투를 벌였던 적이 없다. 앙금을 풀 만큼 전투 마무리를 깔끔하게 한 적도 없다. 그럴수록 증오는 위험수위를 넘어 부풀어 오른다. 전쟁문화가 통하지 않는 남북의 상황은 언제쯤 끝을 맺을까? 걱정이 늘어나는 요즘이다.
철학박사, 중동고 철학교사
timas@joongdong.org
전투라는 목적에서 보자면 군복은 눈에 안 띌수록 좋다. 그러나 전쟁은 ‘영혼이 없는 살인전문 국가공무원’들이 벌이는 사업만은 아니다. 전쟁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영웅심, 명예욕, 과시 욕구 등등 숱한 감정이 끼어든다.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지 않으면 전쟁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전쟁본능> 마틴 판 크레펠트 지음 /이동훈 옮김/살림
| |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