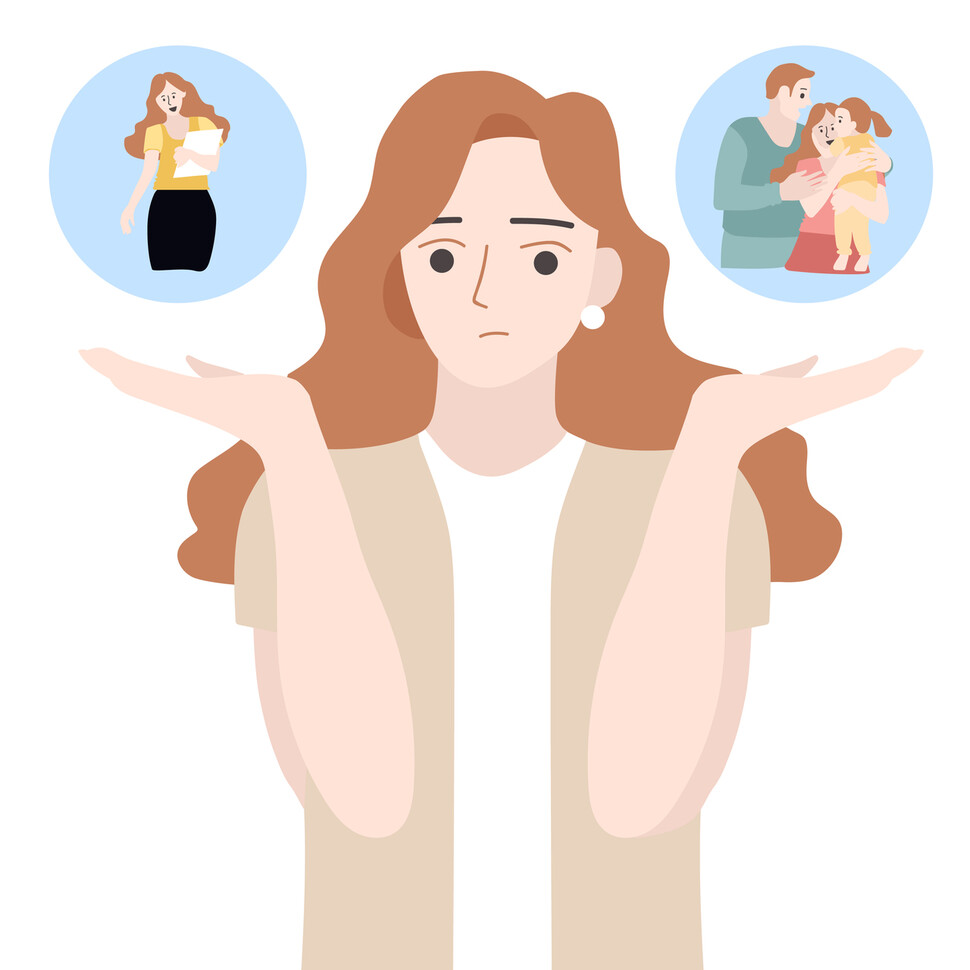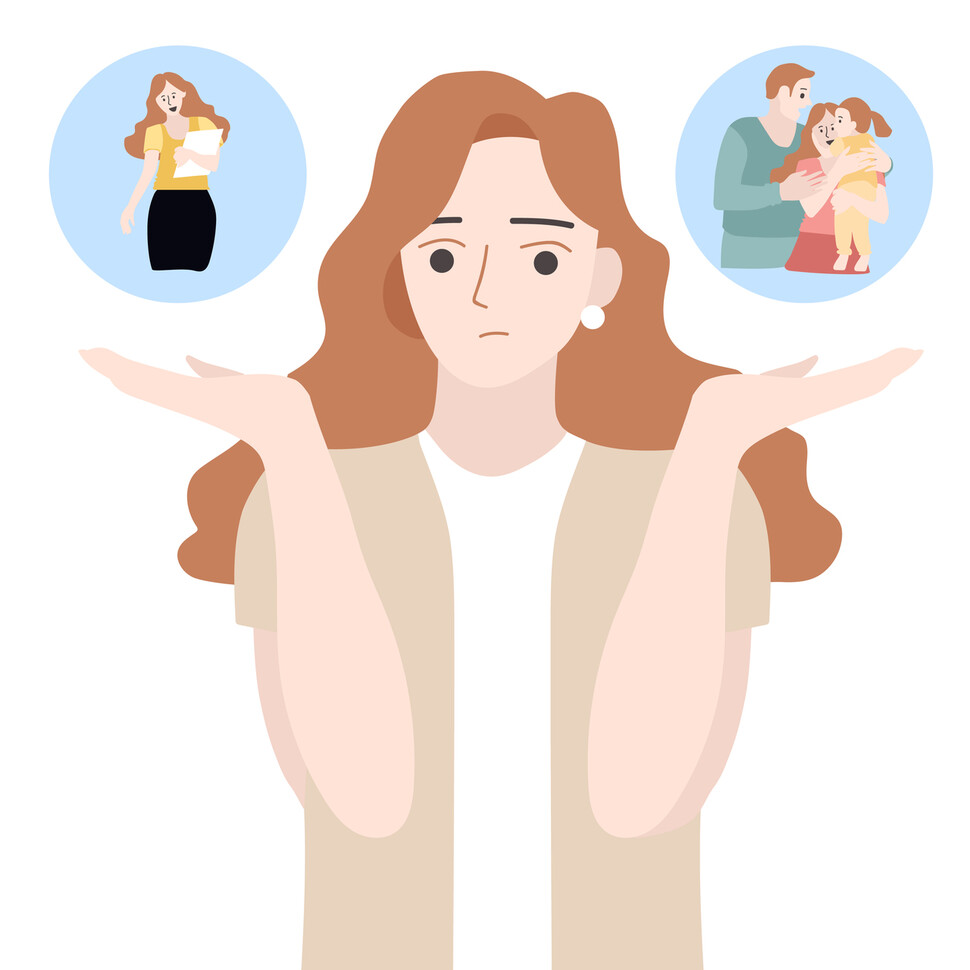“별명이 귀신이잖아. 강의도 나가고, 수술도 많이 하시고, 전공의 논문도 꼼꼼히 봐주시고. 주말엔 등산도 하고 캠핑도 하고 그러면서 출근도 안 늦으시지. 귀신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채송화 신경외과 교수를 설명하는 대사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의사 5인방은 능력은 물론 인성까지 출중하지만 한가지씩이 과잉이어서 웃프다.
그러나 유일한 여성인 채송화에게는 딱히 취약점이 없다. 언제나 반듯하고 꼼꼼하며 사려 깊어 나머지 넷을 정서적으로 돌보기까지 한다. ‘자발적 아웃사이더’라 소개되는 석형은 송화에게만은 속을 내놓고, 가톨릭 신부가 되려는 정원은 중요한 임무를 송화에게 맡긴다. 싱글대디 익준은 응급수술 때 열이 나는 아들을 정성껏 돌봐준 채송화가 애틋하다. 그녀는 일도 잘하고 돌봄도 잘한다.
도처에 널린 콘텐츠들이 이렇듯 ‘귀신같은’ 실재하지 않는 여성을 만들어낸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극장에서 봤던 영화 <미스터 맘마>에서 똑 부러지는 전문직 여성이 싱글대디와 결혼해 돌봄을 착하게 나누는 캐릭터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이후 일 잘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결혼하는 데서 끝나는 무수한 드라마 속 여성들이 1990년대 청소년기를 보낸 내 뇌를 점령했다. ‘그 이후도 행복할 것’이라는 추정과 함께 말이다.
그래서 나는 보는 이들에게 편안하게 스며드는 완벽한 채송화가 불편하다. ‘다 잘할 수 있다’는 판타지를 심을 뿐이라서.
꽤 오랫동안 나는 둘 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워킹대디’는 없고 ‘워킹맘’만 있다는 비판을 숱하게 하면서도, 어쨌든 나는 일도 잘하고 엄마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잘해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끝없이 비난했다. 점점 역량과 시간을 일에 100% 투입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엄마 일만을 하지도 못하는 어중이떠중이 같은 내가 부끄러웠다.
사표를 내던 날 아침, 팀 회의를 하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우리 같이 이거 해보자!” 팀에 큰 프로젝트를 말해놓고, 기초 조사를 수개월째 겉핥기 식으로 하고 있었다. 그날그날 해야 할 일들, 연차가 쌓이면서 내게 주어지는 여러 일을 쳐내지도 못하고 꾸역꾸역 하고 있었다.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게으르고 무능하다 느끼며 나를 계속 혼내고 있었다.
그날은 냉장고도 엉망이었다. 생선구이, 달걀프라이, 시금치와 콩나물로 아이들 반찬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는데 달걀도 생선도 시금치도 콩나물도 다 떨어졌다. 냉장고를 헤집다 집에 온 이모님께 원래 업무가 아닌 장보기를 부탁드리면서 ‘죄송하다’ 말하며 집을 나서는데 뒤꼭지가 뜨거웠다.
‘취약성의 힘’을 설파하며 대중적 심리학자가 된 브레네 브라운은 책 <마음가면>에서 완벽주의의 통념을 바꾼다. 그는 완벽주의는 ‘최고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건전한 성취’가 아니라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방어 체계’라고 설명한다. 완벽주의자들은 대개 어릴 때부터 대부분 자신의 성과(성적, 품행, 규칙 준수, 외모 등)에 대해 칭찬을 받으며 자란 사람들로 성과가 없다면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취약성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한다. 완벽주의라는 방어 체계는 수치심, 자책이라는 감정과 짝꿍이라는 얘기다.
두가지 일을 다 100%로 해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나를 지배하던 ‘둘 다 잘해야 해’ ‘그걸 못하는 나는 무능해’라는 판타지와 자책의 무한 루프는 힘이 셌고 사표로 이어졌다. 요즘은 간간이 둘 다 잘할 수 없음이 들려온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한 예능에서 말했다. “우리 애들은 집밥을 모른다”고. 그녀가 지금의 전문성을 쌓은 데는 ‘완벽한 워킹맘’ 각본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완벽한 그녀들은 모두 판타지일 뿐이다. ‘오늘도 내가 별로야’라고 자책에 빠져 있는 워킹맘이 있다면 브레네 브라운이 알려준 주문을 전한다. ‘이만하면 충분해’ ‘빠르고 지저분한 사람이 경주에서 이겨.’
리담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