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미의 창의적 읽기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임성미의 창의적 읽기 /
13. 낯선 낱말 건져 올려 구워먹기
(어휘 이해하기)
14. 문장을 질문으로 바꾸어보기
(질문하고 답하기)
15. 정리를 해야 기억에 오래 남고 나중에 꺼내 쓰기 쉽다(요약하기) 시험공부를 하면서 예상 문제를 내었는데 진짜로 그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의 통쾌한 기분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만한 일이다. 또 교과서를 읽으면서 질문을 만들어 보았는데 단원 끝에 저자가 만든 질문과 자신이 만든 질문이 똑같았을 때 순간 짜릿함을 느끼기도 한다. 저자와 생각이 통했다는 데서 얻어지는 일종의 희열 같은 것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읽기 교과서에도 글을 읽으면서 중간에 질문을 던져 답을 찾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실천하는 독자가 그리 많지 않다.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도적인 학습법도 결국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다. 그래서 질문을 하며 읽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다. 질문은 일단 “이게 무엇이지?” “왜 그러지?” 하는 호기심에서 출발한다. 호기심은 탐구심을 유발한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읽게 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읽는다. 읽다가 답을 못 찾아도 괜찮다. 답을 찾지 못하면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하면 되니까. 답을 찾지 못해 헷갈리고 오락가락 갈팡질팡해도 괜찮다. 엉뚱한 질문이 독창적인 발견을 가져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세상엔 바보 같은 질문이란 없다. 황순원의 ‘소나기’ 첫 문장, “소년은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 초시네 증손녀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를 읽으면서 이를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다. “윤 초시는 무엇하는 사람일까?” “소년은 소녀가 윤 초시네 증손녀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지?” “왜 하필 개울가일까?” “작가는 왜 굳이 소녀가 윤 초시네 증손녀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을까?” 이런 질문은 이후에 전개될 소설의 흐름과 핵심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스스로 캐내는 일이다. ‘개울가’ ‘윤 초시’는 소설의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질문하고 답하며 읽기는 정보가 많은 글을 읽을 때에 더욱 효과적이다. 글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읽기 때문에 그냥 읽을 때보다 훨씬 더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된다. 막상 시도해 보면 많은 시간이 들지도 않는다. 오히려 습관이 되면 읽기가 재미있어진다. “발 걸려 넘어지는 곳에 보물이 있다”는 말이 있다. 질문이 있는 곳에 생각의 보물이 있다. 임성미 가톨릭대 교육대학원 독서교육과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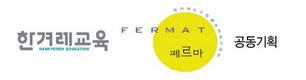
(어휘 이해하기)
14. 문장을 질문으로 바꾸어보기
(질문하고 답하기)
15. 정리를 해야 기억에 오래 남고 나중에 꺼내 쓰기 쉽다(요약하기) 시험공부를 하면서 예상 문제를 내었는데 진짜로 그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의 통쾌한 기분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만한 일이다. 또 교과서를 읽으면서 질문을 만들어 보았는데 단원 끝에 저자가 만든 질문과 자신이 만든 질문이 똑같았을 때 순간 짜릿함을 느끼기도 한다. 저자와 생각이 통했다는 데서 얻어지는 일종의 희열 같은 것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읽기 교과서에도 글을 읽으면서 중간에 질문을 던져 답을 찾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실천하는 독자가 그리 많지 않다.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도적인 학습법도 결국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다. 그래서 질문을 하며 읽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다. 질문은 일단 “이게 무엇이지?” “왜 그러지?” 하는 호기심에서 출발한다. 호기심은 탐구심을 유발한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읽게 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읽는다. 읽다가 답을 못 찾아도 괜찮다. 답을 찾지 못하면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하면 되니까. 답을 찾지 못해 헷갈리고 오락가락 갈팡질팡해도 괜찮다. 엉뚱한 질문이 독창적인 발견을 가져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세상엔 바보 같은 질문이란 없다. 황순원의 ‘소나기’ 첫 문장, “소년은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 초시네 증손녀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를 읽으면서 이를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다. “윤 초시는 무엇하는 사람일까?” “소년은 소녀가 윤 초시네 증손녀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지?” “왜 하필 개울가일까?” “작가는 왜 굳이 소녀가 윤 초시네 증손녀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을까?” 이런 질문은 이후에 전개될 소설의 흐름과 핵심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스스로 캐내는 일이다. ‘개울가’ ‘윤 초시’는 소설의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질문하고 답하며 읽기는 정보가 많은 글을 읽을 때에 더욱 효과적이다. 글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읽기 때문에 그냥 읽을 때보다 훨씬 더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된다. 막상 시도해 보면 많은 시간이 들지도 않는다. 오히려 습관이 되면 읽기가 재미있어진다. “발 걸려 넘어지는 곳에 보물이 있다”는 말이 있다. 질문이 있는 곳에 생각의 보물이 있다. 임성미 가톨릭대 교육대학원 독서교육과 강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