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또 하나의 가족〉
이권우의 요즘 읽은 책 /
〈텔레비전, 또 하나의 가족〉
노명우 지음/프로네시스·12000원 때로는 책의 목차만 보더라도, 지은이의 기발한 착상에 무릎을 치는 경우가 있다. ‘세상으로 난 전자 창문에 대한 텔레비전 키드의 성찰’이라는 긴 부제가 달린 노명우의 책이 그러하다. 온(ON), 볼륨(VOLUME), 채널(CHANNEL), 오프(OFF)로 장을 구성했는데, 그 의도가 신선하다. 요즘이야 다르지만, 기억에 남아 있는 흑백텔레비전의 장치는 꼭 그 정도였다. 텔레비전의 기능을 통해 그것 너머에 숨어 있는 사회학적 의미를 곱씹어 보려는 것 아니겠는가. 노명우의 텔레비전론이 색다른 것은, 제목에 가족이라는 말을 붙인 데서 알 수 있듯, 텔레비전에 거부감이 없다는 데 있다. 학자라면 의당 텔레비전을 바보상자라 몰아붙일 것으로 짐작하기 십상인데, 그는 오히려 텔레비전 키드라 표나게 말한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책은 애초부터 계몽을 꾀하거나 훈시를 늘어놓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 오히려 도시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자란 모던 보이가 자신의 문화적 모태를 낯설게 바라본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책의 앞부분은 미디어의 역사에서 텔레비전이 놓인 자리를 도구-미디어와 환경-미디어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미지와 문자가 벌인 대결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다, 그 어느 것이 일정한 시기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잘 드러나 있다.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텔레비전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열쇳말은 ‘포드주의’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방식이 텔레비전의 젖줄이었던바, 탄생뿐만 아니라 운영방식마저 여기에 포섭되어 있다고 본다. 이 시각은 텔레비전이 태생적으로 탈정치화한 것을 이해하는 데 유효할 뿐 아니라, 오로지 수신만 하고 발신장치가 없는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도 적절하다. 지은이가 보기에 텔레비전은 “거대한 일방통행로”다. 이는 텔레비전이, 기 드보르가 말한 수동적 수용을 요구하는 볼거리라는 뜻을 담은, 스펙터클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이제 “텔레비전은 외부에서 내부로 침투하는 채널을 확보했지만, 개인은 자신을 외부로 드러낼 수 있는 기능버튼을 텔레비전에서 찾을 수 없기에 정치적으로 무력화된다.” 절망적인 분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대는 이미 탈포드주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여기에 걸맞은 뉴미디어는 인터넷이다. 두 매체의 차이는 응답 가능성에 있다. 인터넷은 획기적이고 폭발적으로 다자간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실현했다. 그렇다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 웹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방식이 텔레비전으로 상징되는 중앙집권 시스템과 벌인 싸움에서 보인 한계 때문이다. 촛불시위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는 인터넷이 우세를 보이지만, 개인들의 일상을 점령한 것은 여전히 텔레비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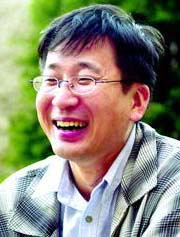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은이는 오프 기능을 정성들여 설명한다. 핵심은 수신자와 발신자 사이의 대화 가능성에 있다. 이것을 가로막는 텔레비전은 “문명의 실어증”을 일으킨다. 이를 복원하는 것은 “텔레비전 시대에 일종의 혁명”이다. 텔레비전을 끄는 것은, 의사소통의 흐름을 새롭게 만들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잃어버린 말을 되찾고 고유명사로 복귀하라.” 텔레비전이라는 괴물에 맞서려는 사람들이 기억해둘 만한 구절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은이는 오프 기능을 정성들여 설명한다. 핵심은 수신자와 발신자 사이의 대화 가능성에 있다. 이것을 가로막는 텔레비전은 “문명의 실어증”을 일으킨다. 이를 복원하는 것은 “텔레비전 시대에 일종의 혁명”이다. 텔레비전을 끄는 것은, 의사소통의 흐름을 새롭게 만들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잃어버린 말을 되찾고 고유명사로 복귀하라.” 텔레비전이라는 괴물에 맞서려는 사람들이 기억해둘 만한 구절이다.
이권우 도서평론가
노명우 지음/프로네시스·12000원 때로는 책의 목차만 보더라도, 지은이의 기발한 착상에 무릎을 치는 경우가 있다. ‘세상으로 난 전자 창문에 대한 텔레비전 키드의 성찰’이라는 긴 부제가 달린 노명우의 책이 그러하다. 온(ON), 볼륨(VOLUME), 채널(CHANNEL), 오프(OFF)로 장을 구성했는데, 그 의도가 신선하다. 요즘이야 다르지만, 기억에 남아 있는 흑백텔레비전의 장치는 꼭 그 정도였다. 텔레비전의 기능을 통해 그것 너머에 숨어 있는 사회학적 의미를 곱씹어 보려는 것 아니겠는가. 노명우의 텔레비전론이 색다른 것은, 제목에 가족이라는 말을 붙인 데서 알 수 있듯, 텔레비전에 거부감이 없다는 데 있다. 학자라면 의당 텔레비전을 바보상자라 몰아붙일 것으로 짐작하기 십상인데, 그는 오히려 텔레비전 키드라 표나게 말한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책은 애초부터 계몽을 꾀하거나 훈시를 늘어놓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 오히려 도시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자란 모던 보이가 자신의 문화적 모태를 낯설게 바라본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책의 앞부분은 미디어의 역사에서 텔레비전이 놓인 자리를 도구-미디어와 환경-미디어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미지와 문자가 벌인 대결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다, 그 어느 것이 일정한 시기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잘 드러나 있다.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텔레비전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열쇳말은 ‘포드주의’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방식이 텔레비전의 젖줄이었던바, 탄생뿐만 아니라 운영방식마저 여기에 포섭되어 있다고 본다. 이 시각은 텔레비전이 태생적으로 탈정치화한 것을 이해하는 데 유효할 뿐 아니라, 오로지 수신만 하고 발신장치가 없는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도 적절하다. 지은이가 보기에 텔레비전은 “거대한 일방통행로”다. 이는 텔레비전이, 기 드보르가 말한 수동적 수용을 요구하는 볼거리라는 뜻을 담은, 스펙터클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이제 “텔레비전은 외부에서 내부로 침투하는 채널을 확보했지만, 개인은 자신을 외부로 드러낼 수 있는 기능버튼을 텔레비전에서 찾을 수 없기에 정치적으로 무력화된다.” 절망적인 분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대는 이미 탈포드주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여기에 걸맞은 뉴미디어는 인터넷이다. 두 매체의 차이는 응답 가능성에 있다. 인터넷은 획기적이고 폭발적으로 다자간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실현했다. 그렇다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 웹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방식이 텔레비전으로 상징되는 중앙집권 시스템과 벌인 싸움에서 보인 한계 때문이다. 촛불시위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는 인터넷이 우세를 보이지만, 개인들의 일상을 점령한 것은 여전히 텔레비전이다.
이권우의 요즘 읽은 책
이권우 도서평론가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